BAC NEWS
금오도 - 섬앤산

//이미지//
고종이 명성황후에게 선물한 섬, 식생 우수하며, 다도해국립공원 비경 갖춰
세상을 살아가다 문득 그리워지는 바다가 있다. 콱 막힌 가슴이, 바다 앞에 서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바이러스가 옥죄여 오는 요즘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엉키기만 할 뿐, 풀리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럴 때는 바다가 약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해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바람 부는 섬산 능선에 올라서면 생각할 틈 주지 않고 덮쳐오는 원초적인 파랑에 감각이 포위된다. 때 묻지 않은 바다와 산의 협공, 행복한 고립에 빠지게 된다. 걷는 것만으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곳, 여수 금오도를 소개한다.
//이미지//
//이미지//
금오도는 우리나라 섬 중 21번째로 크다. 섬이 마치 ‘황금빛 자라’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금오도金鰲島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여수 돌산의 남쪽으로 뻗어 있는 여러 섬과 함께 금오열도를 이루고 있다.
과거엔 사슴이 떼 지어 살 정도로 자연환경이 뛰어났던 곳이다. 특히 금오도의 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판옥선을 만드는 황장목으로 쓰일 만큼 귀중하게 다뤄졌다. 조선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며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이 섬은 1885년 봉산封山 해제 이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고종은 금오도를 아내인 명성황후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명성황후는 이곳에 사슴목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사랑한 섬’이란 문구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다녀간 적은 없다. 지금도 서울에서 반나절 이상 걸리니, 당시에는 먼 오지였다.
금오도가 고향인 김병호 선생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비렁길을 걷는다. ‘비렁’은 벼랑의 여수사투리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18.5㎞의 걷기길이다. 모두 5개 코스로 나뉘어 있으며 8~9시간 정도 걸린다.
숲이 울창하다. 다른 섬에 비해 다양한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왕실의 봉인된 섬이었던 까닭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유독 이 섬만 숲이 짙어 검게 보인다고 하여 ‘거무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나뭇가지에도, 바닥에도 붉은 저고리 입은 여인이 있다. 시골 미인마냥 큼직한 통꽃 동백, 이토록 순수한 빨강은 본 적 없다.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지만 독하게 눈 맞아 돌아오지 않는 사람처럼, 지독한 일편단심에 차마 꽃을 밟을 수 없다. 김병호 선생이 “동백꽃은 가지에서 피고, 땅에 떨어져서 피고, 사람 가슴에서 핀다”며 세 번 피는 동백의 내력을 알려 준다.
//이미지//
짙은 대나무숲이 마중 나오고, 일탈을 감행한다. 편안한 비렁길 1코스를 벗어나, 조성 중인 완전치 않은 샛길로 든다. 김 선생은 “보여 줄 것이 있다”며 길을 이끈다. 벙커는 오래도록 방치되었는지 넝쿨과 어우러져 유적이 되었다. 길인 듯 길 아닌 듯한 은밀한 정글숲 끝에 닿자, 반전 풍경이 펼쳐진다. 바다와 섬이 만나는 모퉁이 끝에 솟은 하얀 등대. 용머리등대다. 이름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정적인 등대와 망망대해가 만나 단순명료하지만 강렬한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여운이 있어 가풀막을 따라 1코스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다. 반듯한 데크길은 별 어려움 없이 바다경치를 실컷 보여 준다. 인심 좋은 시골 백반집처럼 곳곳에서 터지는 경치에 셔터를 누르는 주민욱 사진기자의 손이 바빠진다. 모처럼 젊은 아웃도어 마니아들이 동행했다. 블랙야크 강휘성, 정회욱, 최제우 사원이 바닷바람 앞에 섰다.
//이미지//
압도적 시원함, 미역널방 전망대다. 실제로 미역을 널었던 볕이 잘 드는 벼랑 끝으로 튀어나온 마당바위다. 건너편 나로도가 그려 놓은 순한 능선이 평화롭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조명처럼 바다를 비춘다. 한 굽이 돌아서자 잘 생긴 암벽이 나오고 아래에 너른 송광사 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모후산에 올라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학한 새 세 마리를 날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에, 한 마리는 고흥 송광암에, 마지막 한 마리는 이곳에 날아왔다고 한다. 이 세 곳에 세운 절을 삼송광三松廣이라 부른다.
//이미지//
//이미지//
다도해 풍경을 과식한 탓에 걸음이 느리다. 2코스까지 가지 못하고 함구미로 하산한다. 경치 좋은 해안절벽에서 야영하려 했으나, 섬 자체가 국립공원이라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 금오도에서 가장 유명한 금오도캠핑장으로 이동한다. 평일에도 캠핑객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이곳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바다 경치는 기본이고, 샤워장과 화장실 같은 주변시설이 깔끔하다.
대부산 잘못된 이름, 매봉산이 맞아
각자 개인 텐트를 가져와 자기 텐트에서 숙면을 취하고 맞은 아침. 봄이라기엔 바람이 차갑고, 겨울이라기엔 매화가 지나치게 화사하다. 함구미마을에서 매봉산으로 올려친다. 인터넷 포털 지도에는 대부산이라 쓰여 있으나, 이곳이 고향인 김병호 선생은 “잘못된 이름”이라 목소리 높인다. 일제강점기 두모리 일대의 땅을 정부에 빌려(대부) 밭을 일궜다 하여 생긴 이름이 대부산이며, 대부분의 섬사람은 원래 이름인 ‘매봉산’으로 불렀다는 것. 여느 매봉산이 그러하듯 매가 많이 사는 산이라 하여 유래한다.
산 중턱의 정겨운 돌담길은 흔적으로만 남은 중터마을. 100년이 넘었다는 마을 가운데의 비자나무만 홀로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섬산답게 높이는 382m로 낮아도 오르막은 짧지 않다. 외부인의 출입이 봉인된 산이었던 덕분에 지금도 다양한 나무
//이미지//
< 금오도 지도 >
내륙 깊숙한 곳인양 경치를 꽁꽁 숨겨두었던 매봉산은 주능선 암릉에 이르러서야 트인 경치를 선물한다. 육지 방면으로 현란한 해안선이 흘러가고, 꼬리 치는 강아지처럼 바람이 와락 안긴다. 오름길의 땀방울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꽃샘바람. 한동안 바람 길 위에 머무르며, 임호상 시인의 시 ‘금오도’를 읊어본다.
‘오지마라 / 이곳은 왕의 나라, 황후의 섬 (중략) 벼랑 끝 내몰리던 간절함으로 오라 / 비렁길 걷는 어디에도 / 경건하지 않은 곳 있으랴 / 금오도 올 때는 / 그대, 아름다운 섬이 되어 오라’
이제 산행의 달콤한 부분만 남았다. 편안한 능선을 따라 간간이 터지는 남해와 여수 앞 바다의 경치를 야금야금 만끽한다. 태풍에 무너진 팔각정이 있던 터를 지나 짙은 소사나무 숲으로 든다. 에델바이스처럼 순수한 섬세함을 피운 산자고가 눈길을 잡아끈다. 쥐똥나무와 가시나무가 푸른 잎으로 건강한 숲의 식생을 과시한다.
정상은 별 볼일 없다. 이정표와 삼각점뿐, 빠르게 BAC 인증사진을 찍고 드문드문 펼져지는 남도의 선경을 마음에 쏟아 넣고, 여천항으로 내려선다. 목을 꺾고 떨어진 붉은 마음이 바닥에 있다. 끝났다고 방심한 순간, 훅 치고 들어온 동백이 가슴에서 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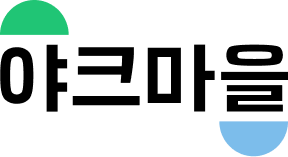
 목록
목록









